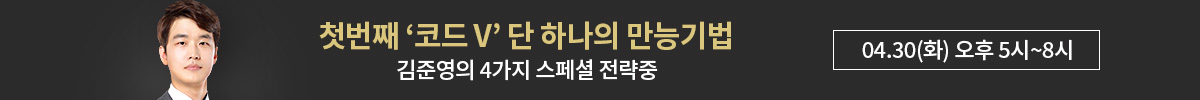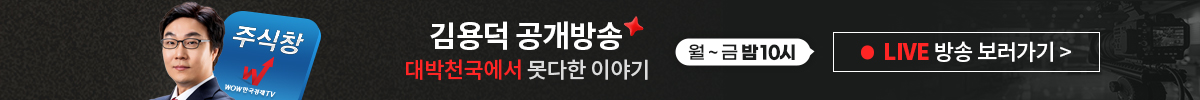암호화폐는 태생적인 익명성 때문에 ‘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높다. 현금으로 바꿔 인출하기 전까지 실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다양한 코인을 수천 차례에 걸쳐 거래하면서 돈을 쪼개고 합치는 수법도 횡행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코인 가격이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는 중국인의 불법적인 해외 송금이 급증해 국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현금화가 이뤄지는 단계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제도권에서 감독·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소극적이었다. 자칫하면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암호화폐를 사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은행들에 일차적인 모니터링 책임을 지워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거래와 관련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암호화폐 출금 때 금융사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금융사에 암호화폐 의심거래 유형을 전달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조사 의뢰를 당부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한 의심거래 유형은 쪼개기 송금, 분산 송금 등 이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거래를 거절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대상이었다. 현장에서는 ‘뒷북 행정’이란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9월부터 암호화폐거래소도 금융회사처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 역시 은행들이 사실상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연결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은행이 거래소와 실명 계좌 거래를 맺을 때 자체적으로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도와 안전성, 건전성 등을 평가해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상세한 평가 항목과 기준 등도 은행이 알아서 정해야 한다. 계좌를 내준 거래소에서 돈세탁 사고가 나면 해당 은행도 책임에 휘말릴 수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암호화폐거래소를 평가할 때 필요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18개 은행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체 비용을 들여 마련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