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늦은 시간에 택시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흥의 밤이 되살아났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이러다 보니 위기가 끝나가는 건 아닐까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감염병 공포와 확진자 수, 마스크에만 매몰돼 진짜 위기의 실체를 못 봤기 때문이다. 산업과 경제, 사회의 급변은 생각보다 많은 위기로 이어진다. 팬데믹이 끝나도 결코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 있었던 일은 꼭 일어날 일에 영향을 준다. 2022년을 희망찬 해로 여기는 이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마스크를 벗더라도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후자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다. 팬데믹은 보건 건강의 악재, 전염병이 핵심이 아니라 산업적 진화가 가속화한 시기이며, 새로운 경제위기가 심화한 시기다. 우리가 뉴노멀이란 말을 많이 쓴다는 것은 실제로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변화는 늘 기회만 주진 않는다. 팬데믹이 초래한 뉴노멀은 이제 시작이다. 2021년보다 더 많은 변화가 2022년에 생길 수 있고, 경제위기 상황도 부각될 수 있다. 아마도 뉴노멀 관련 검색량이 새로운 피크를 찍을지도 모른다. 그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뉴노멀은 일방적이다. 모두의 필요에 의해 뉴노멀이 대두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다. 수많은 변화가 뉴노멀로 포장되면 저항할 수도 없어진다. 실제로 뉴노멀은 변화를 거부할 선택권이 없는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이상기후가 보편화한 시대, 기후도 뉴노멀이다. 안타깝지만 이 변화 역시 거부할 수 없다. 경제위기가 초래한 뉴노멀이나, 기후위기가 초래한 뉴노멀이나, 팬데믹이 초래한 뉴노멀 모두 거부할 수 없는 변화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결합한 시대다. 그래서 더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려 각국에서 푼 막대한 돈은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이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 확대될수록 발생할 그린플레이션(그린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다. 자동화 확대와 일자리 문제, 양극화 심화와 빈곤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도 결국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걸 개인이나 기업이 온전히 다 감당하긴 어렵다. 그래서 ‘베터 노멀(better normal)’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이나 다음이나 그 역할을 잘 할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은 지울 수 없다. 뉴노멀, 4차 산업혁명 같은 키워드를 구호이자 유행어처럼 쓰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는 꽤 많지만, 그 속에 담긴 위기와 기회에 대해 냉정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심각한 위기까지 내몰리고 나서야 답을 찾겠다고 나설 것이다. 그들의 무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린스완(green swan)은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위기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기후를 겪지만, 어떤 이상기후가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위기가 불확실성이 높고 극단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 온도 1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정확히 예측하진 못한다. 예상도 못한 일이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 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금융기구와 경제기구, 중앙은행들이 그린스완에 대한 대응을 화두로 삼고 있다. 그린스완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 ‘The green swan’에서 처음 언급됐다. 기후위기 시대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이란 부제가 붙은 보고서인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닥치기 전엔 미처 몰랐다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서야 블랙스완이란 화두를 결과론적으로 붙였다면, 기후위기가 초래할 금융위기는 아직 닥치기 전이다. 발생할 사건의 예측도 어렵고, 매우 복잡하게 드러나겠지만 분명한 건 머지않아 확실히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역사상 가장 가혹할 수도 있다.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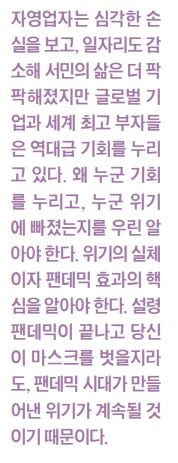 팬데믹은 자동화를 가속화했다. 그리고 한 번 가속화된 자동화, 로봇의 확산은 멈출 수 없다. 닛산의 전기차 ‘아리야(Ariya)’ 전용 공장은 완전 자동화에 가까운 생산 라인이다. 그동안 자동차 공장에 로봇 팔과 자동화 설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생산 라인이 바뀌면 인력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쓴다는 전제하에서다. 만약 생산 라인을 더 자동화하면 줄어드는 인력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마지막에 사라질 것으로 봤던 차량 페인트(도장) 최종 검사나 전체적인 종합 검사에 투입된 매의 눈 같은 노련한 노동자들의 역할이 자동화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회사 생산직 노조에선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길 바란다는 얘길 들었다. 이해는 간다. 자신들의 일자리, 즉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회사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결국엔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생산 라인의 인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 공장에서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주유소와 정비소의 타격도 커진다.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 제주도에선 이미 타격이 가시화됐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연기관을 계속 줄어가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주유소와 정비소, 그리고 생산 라인의 인력들은 생존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캐스퍼는 이쁘고 비싼 경차가 핵심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이 차를 100%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100% 온라인으로, 즉 플랫폼으로 팔았지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영업조직과 노조의 저항을 받았다. 현대차·기아가 수년간 수차례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다가 멈췄는데, 2021년에 드디어 가능해졌다. 원래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차량 판매 방식은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수탁생산하는 차량이다. 현대차의 공장도 아니고, 노조와도 무관하다. 현대차 노조가 반발했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거대한 둑에 구멍이 났다. 아주 거대한 둑도 작은 금이 가고, 그것이 구멍으로 커지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진다. 변화의 시작은 대개 이렇다. 변화는 늘 모두에게 해피엔딩은 아니다. 때론 아주 가혹하다. 사회적, 산업적 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돕고, 일자리를 지키려다 기업의 변화 속도가 늦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도 중요해진다.
팬데믹은 자동화를 가속화했다. 그리고 한 번 가속화된 자동화, 로봇의 확산은 멈출 수 없다. 닛산의 전기차 ‘아리야(Ariya)’ 전용 공장은 완전 자동화에 가까운 생산 라인이다. 그동안 자동차 공장에 로봇 팔과 자동화 설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생산 라인이 바뀌면 인력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쓴다는 전제하에서다. 만약 생산 라인을 더 자동화하면 줄어드는 인력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마지막에 사라질 것으로 봤던 차량 페인트(도장) 최종 검사나 전체적인 종합 검사에 투입된 매의 눈 같은 노련한 노동자들의 역할이 자동화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회사 생산직 노조에선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길 바란다는 얘길 들었다. 이해는 간다. 자신들의 일자리, 즉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법은 회사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결국엔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생산 라인의 인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 공장에서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주유소와 정비소의 타격도 커진다.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 제주도에선 이미 타격이 가시화됐다.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연기관을 계속 줄어가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주유소와 정비소, 그리고 생산 라인의 인력들은 생존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캐스퍼는 이쁘고 비싼 경차가 핵심이 아니다. 진짜 핵심은 이 차를 100%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100% 온라인으로, 즉 플랫폼으로 팔았지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영업조직과 노조의 저항을 받았다. 현대차·기아가 수년간 수차례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다가 멈췄는데, 2021년에 드디어 가능해졌다. 원래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차량 판매 방식은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캐스퍼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수탁생산하는 차량이다. 현대차의 공장도 아니고, 노조와도 무관하다. 현대차 노조가 반발했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거대한 둑에 구멍이 났다. 아주 거대한 둑도 작은 금이 가고, 그것이 구멍으로 커지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진다. 변화의 시작은 대개 이렇다. 변화는 늘 모두에게 해피엔딩은 아니다. 때론 아주 가혹하다. 사회적, 산업적 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돕고, 일자리를 지키려다 기업의 변화 속도가 늦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도 중요해진다.■ 김용섭은
 트렌드 인사이트&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트렌드 분석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2500회 넘는 강연과 비즈니스 워크숍을 했고, 20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유튜브 채널 ‘김용섭 INSIGHT’를 통해 트렌드를 읽어준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22: Better Normal Life》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라이프 트렌드 2021: Fight or Flight》 《언컨택트》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외 다수가 있다.
트렌드 인사이트&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Trend Insight & Business Creativity)를 연구하는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자 트렌드 분석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2500회 넘는 강연과 비즈니스 워크숍을 했고, 20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유튜브 채널 ‘김용섭 INSIGHT’를 통해 트렌드를 읽어준다. 저서로 《라이프 트렌드 2022: Better Normal Life》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라이프 트렌드 2021: Fight or Flight》 《언컨택트》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외 다수가 있다.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