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제계는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피소 소식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그간 ‘특허괴물’을 비롯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사진)은 재직 당시 특허 소송에만 매달렸을 뿐 해당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부사장과 그가 몸담은 시너지IP는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공동원고를 맡은 미국 델라웨어의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테키야가 주장하는 특허 권리의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제계는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피소 소식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그간 ‘특허괴물’을 비롯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사진)은 재직 당시 특허 소송에만 매달렸을 뿐 해당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부사장과 그가 몸담은 시너지IP는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공동원고를 맡은 미국 델라웨어의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테키야가 주장하는 특허 권리의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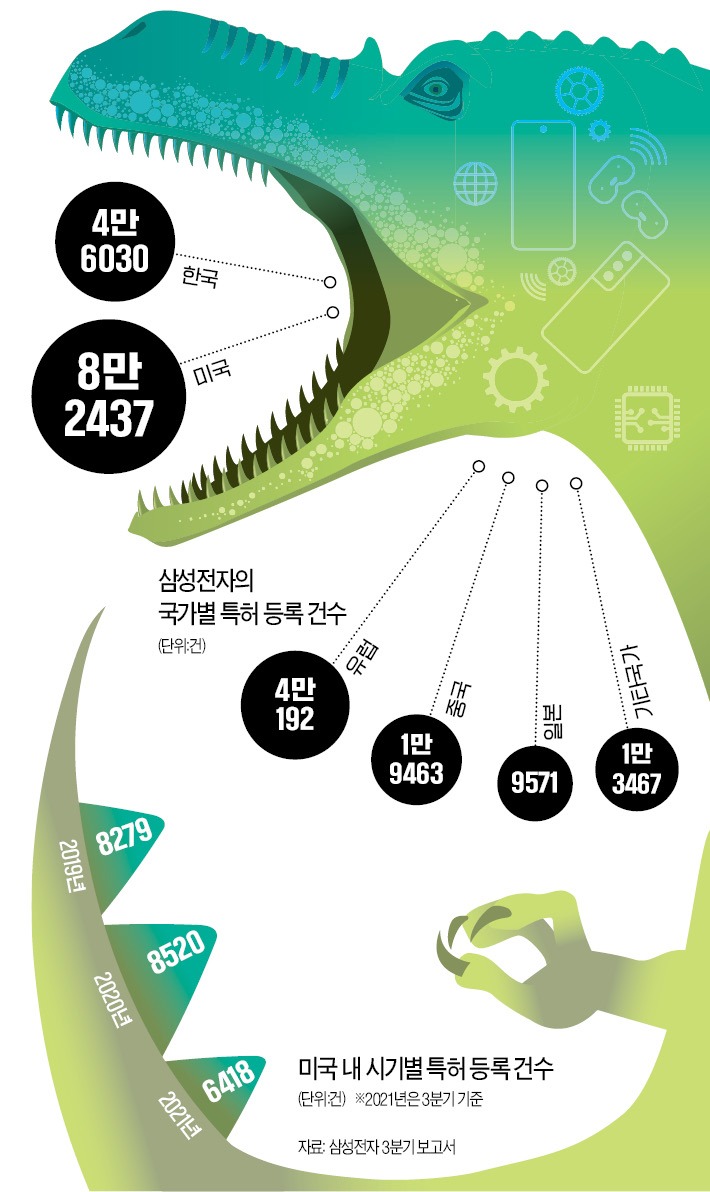
업계에서는 이들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이어폰과 관련 음성인식 기술은 관련 특허 간에 차이점이 크지 않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당수 기업은 이미 미국 법원에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을 두고 IPR(지식재산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테키야의 최근 특허와 관련한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테키야는 원래 이어폰과 음향기기 전문 회사였지만 회사 경영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특허와 관련된 영업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업계에선 안 전 부사장의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허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안 전 부사장이 직업윤리를 의심받을 수 있는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이 오랜 기간 고위 임원직에 있었던 데다 퇴임도 정년에 맞춰서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 대부분과 상호특허 사용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상호 간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할 경우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특허법인과 기업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