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의 주요 기능이 중단된 지 사흘째지만 여전히 다음 메일 등 일부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카카오의 이번 ‘먹통’ 사태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카카오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한때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강조된 해외 앱으로의 ‘망명’이 이어진 적도 있지만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2012년 이후 4000만 명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앱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잡은 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데 돈 쓸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다.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이 늦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보보호 등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 올해 각사가 공개한 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107명, 관련 비용은 350억원이지만 카카오의 전담인력은 61명, 비용은 140억원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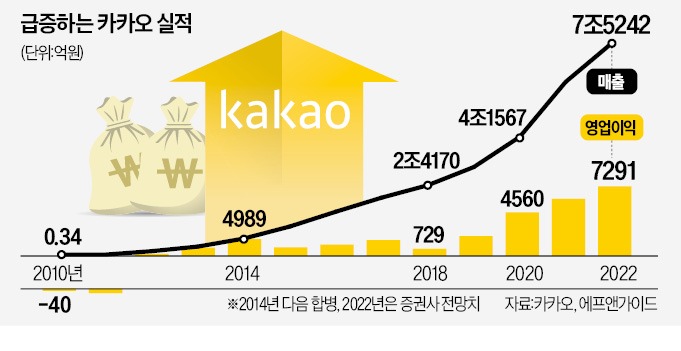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모펀드(PEF)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TPG캐피털에서 2500억원,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서 250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TPG컨소시엄(TPG·한국투자파트너스·오릭스)이 24%, 칼라일이 6.2%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17.6%를 보유 중이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FI들이 주주로 참여하면서 회사의 미래 전략에 ‘외풍’이 자주 불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스톡옵션 비율도 높은 편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법상 스톡옵션 한도인 발행주식 수의 10%를 거의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자회사 분할상장 등의 바람을 타고 경영진 사이에서 ‘출구전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과 같은 투자 의사 결정을 주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평가다.
카카오의 문제는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카카오의 보안과 데이터 관리 수준은 한국 IT 생태계 전체의 수준과 직결돼 있다. 한 IT 소프트웨어 대표는 “카카오의 경쟁상대가 없다 보니 위기감도 희박해진 것”이라며 “연못 속 고래 역할에 그치지 말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이승우 기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