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톨이, 너드(nerd), 다소 불쾌한 친구….
몸을 흔드는 버릇이 있던 작고 마른 한 소년을 친구들은 이같이 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소년은 책과 수학에만 몰두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커서 뭐가 될지 걱정’하던 이 소년은 훗날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우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빌 게이츠는 올해 70세를 맞아 자신의 유년 시절을 담은 첫 자서전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을 출간했다. 지난 5일 한국어판으로 나온 자서전은 3부작 가운데 첫 번째 책이다. 1955년 출생부터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까지 20년에 걸친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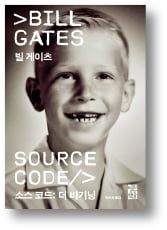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책 읽기, 수학 문제 풀기 등 본인이 꽂힌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성적은 과목마다 들쑥날쑥했다. 한 교사는 그를 ‘지진아(retarded)’라고 평가하며 부모에게 유급을 권하기도 했다.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책 읽기, 수학 문제 풀기 등 본인이 꽂힌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성적은 과목마다 들쑥날쑥했다. 한 교사는 그를 ‘지진아(retarded)’라고 평가하며 부모에게 유급을 권하기도 했다.기대치가 높고 엄한 어머니와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게이츠의 학교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하지만 게이츠의 반항기는 점차 심해졌다. 한 번은 저녁 식사 도중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게이츠가 아버지로부터 ‘물싸대기’를 맞기도 했다. 사춘기였던 것인지, 이때 게이츠는 “샤워, 고맙네요”라고 싸늘하게 맞받아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게이츠의 부모는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두지 않았다. 변호사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를 둔 덕에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겨우 13세이던 1968년 명문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이었다. 게이츠는 이곳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간단한 게임을 개발하는 등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갔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도 여기서 만났다. 그는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고찰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며 “프로그램은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를 자극했다”고 돌이켰다.
컴퓨터 천재였던 게이츠는 1973년 하버드대 입학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강의실을 찾아 헤매는 꿈을 꿀 정도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자신 있던 수학 과목도 모두가 전교 1등 출신인 하버드대에선 경쟁이 쉽지 않았다. 자연스레 컴퓨터를 직업으로 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갔다. 게이츠는 “코딩 실력이 늘면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며 “컴퓨터만 있으면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썼다.
그는 명석한 두뇌를 타고났지만 노력파이기도 했다. 게이츠는 “공부와 프로그래밍을 병행하며 36시간 연속 깨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학교 2학년이던 1975년 세계 최초의 조립식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8800’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베이직(BASIC)’을 개발했다. 베이직은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직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게이츠는 회사 이름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짓고, 하버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게이츠는 자신이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한다. “나는 불로소득 같은 특권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유한 미국에서, 그것도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일종의 출생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게이츠재단’을 설립해 자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역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미덕을 강조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유방암을 앓다가 1994년, 6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게이츠가 39세일 무렵이다. 게이츠는 “내가 기대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충분히 확인할 만큼 오래 머물지 않고 내 곁을 떠난 어머니가 안타깝고 그립다”며 애도했다.
게이츠는 이번 집필을 통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길 열망하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시절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회고록과 게이츠재단 활동을 조명하는 세 번째 책도 쓸 예정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