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부터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접하면 2500년 전 인물이 이처럼 현대적이고 정교한 책을 썼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사회 안정을 위해 민주주의와 중산층 확산에 주목한 선구자다. 동시에 노예제의 정당화나 우생학의 설파 같은 현대인의 시각에선 당혹스러운 주장도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런 목소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간단히 폐기할 수 있을까.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라는 종(種)이 지닌 정치적 본질,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한 통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라는 표현도 이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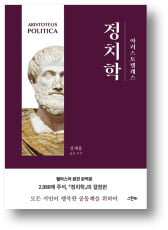 하나의 담론으로서 최초로 ‘정치학’을 다룬 이 책은 명료한 개념과 풍부한 경험을 조합해 논의를 전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 세계관 같은 것에 호소하지 않는다. 이 덕분에 현대적 맥락에서도 손쉽게 수용된다.
하나의 담론으로서 최초로 ‘정치학’을 다룬 이 책은 명료한 개념과 풍부한 경험을 조합해 논의를 전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 세계관 같은 것에 호소하지 않는다. 이 덕분에 현대적 맥락에서도 손쉽게 수용된다.총 여덟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관된 논조로 통일성을 갖춘 저작은 아니다. 기원전 345년에서 325년 사이, 최소 20년에 걸쳐 발전한 텍스트인 까닭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차별’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정의는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한 몫을 주는 것’이라며 저자가 ‘동등함’을 중시했던 만큼,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먼저 구분해야 했다.
책을 펴자마자 등장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가 ‘노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의 저자라면 입에 올리지 못했을 내용을 노골적으로 설파한다. 그는 ‘사고에 의해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자연에 따라 지배하는 주인’과 ‘자연에 근거한 노예’로 사람을 나누고, ‘여성과 노예가 구별되는 것도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또 ‘자유인은 노예를 지배하고,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어른은 아이를 지배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그려낸다. ‘불구아는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 의식’은 고대인의 인식을 일방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할까. 대부분 고대 문헌은 노예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대의 저술처럼 주장마다 반론을 염두에 둔다. 노예를 판별하는 기준도 당대 통념과 다르다.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은 ‘신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적 노예’라고 단언한다. 노예의 본질적 특성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전체 논지를 봐도 그를 차별주의자로 단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도 인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모여 함께할 때는 소수인 가장 좋은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며 보통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잘 통치되는 폴리스란 중간층이 많아서 다른 두 부분(부유층과 빈곤층)보다 힘이 있는 곳’이라며 사회 안정의 요소로 중산층을 지목한다. 이런 다면성이야말로 수천 년간 책이 꾸준히 힘을 얻은 이유일 것이다.
김동욱 한경매거진&북 편집주간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