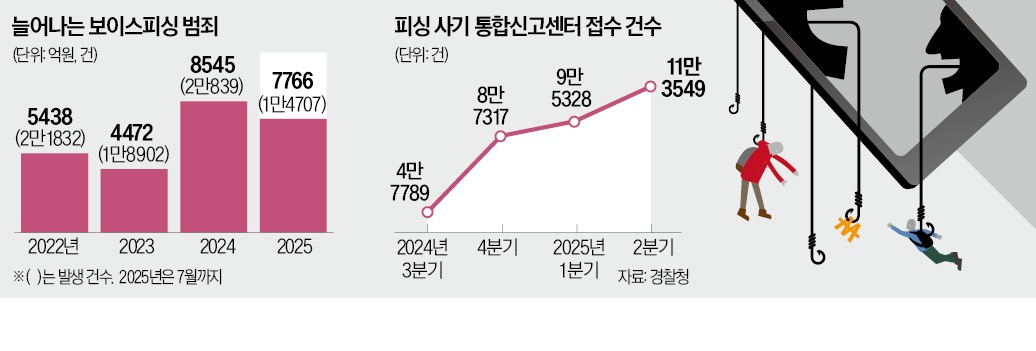
정부 발표 후 은행권에선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의 금융권 관계자는 “범죄자는 따로 있는데 제3자가 배상하는 것은 일단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사실상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배상받는 신종 사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무과실 책임 원칙에 관한 법률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러 사람이 공모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속여 배상받는 게 가능하면 범죄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상을 막으려면 범죄 가능성 자체를 최대한 차단해야 하고, 그러려면 특정 연령만 허용하는 등 송금 자체를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이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무과실 배상 책임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속해서 범죄를 막기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최근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대폭 늘리고, AI가 수상한 거래 유형을 미리 파악해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본인 인증 절차에 안면 인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례도 느는 추세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