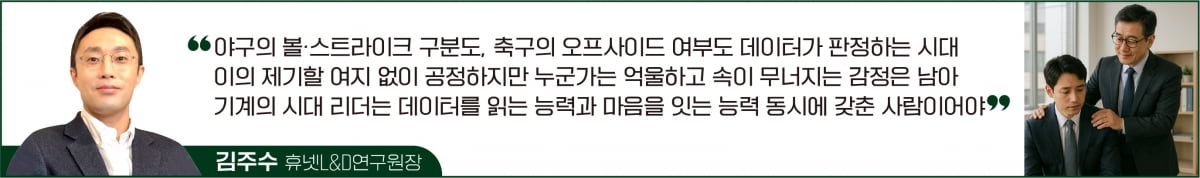
보비 콕스(Bobby Cox).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전설적 감독이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한 장면이 떠오른다. 석연치 않은 판정에 반사적으로 덕아웃을 뛰쳐나오는 모습. 1996년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그는 월드시리즈에서만 두 번째 퇴장을 당한다. 야구사에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콕스의 통산 퇴장 횟수 역시 독보적이다. 무려 162회. 앞으로 어떤 다혈질 감독이 나타난다 해도 깨지기 어려운 기록일 것이다. 메이저리그는 2008년부터 홈런 판정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4년에는 아웃·세이프 판정까지 도입 범위를 넓혔다. 2026년부터는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는 감독의 격렬한 항의 대신, 비디오 판독 결과를 기다리는 풍경이 야구장의 새로운 볼거리가 됐다.
축구도 달라졌다. 비디오 판독(VAR: Video Assistant Referee)이 등장한 뒤로, 골문 앞에서의 열광은 잠시 멈춘다. 심판이 판정을 기다리는 몇 초 동안 경기장은 숨을 죽인다. 이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다.
판정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계로, 감각에서 데이터로 옮겨가면서 경기장의 질서 또한 바뀌었다. 이제는 조직과 리더십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때이다. 기술이 공정함을 담보하는 시대, 리더는 무엇을 지켜내야 할까?
<i>#권위에서 데이터로</i>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 한 마디면 충분한 때가 있었다. 경험이 논리를 앞섰고, 목소리 크기가 영향력을 결정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히포’가 회의실에 들어오면 누구도 감히 의견을 내지 못했다. 여기서 히포는 하마가 아니다. HiPPO, Highest Paid Person’s Opinion.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의견’을 뜻한다.
HiPPO는 단순한 밈이 아니다. 권위에 기대어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보내는 경고의 신호다. 감(感)을 근거로 삼고, 지위를 논리로 세우는 순간 심리적 안전감은 무너진다. 그때부터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자취를 감춘다.
권위가 리더십을 증명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경기장에서는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됐다. 스포츠는 숫자로 말하는 세계다. 투구 속도와 회전수, 타구 궤적, 활동 거리, 슛 성공률과 수비 효율 등 수많은 움직임이 데이터로 기록된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다. 선수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지도자는 그 숫자 속에서 흐름을 읽고 판단의 근거를 세워야 한다.
조직 역시 다르지 않다. “내 감으로는 이게 맞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무게감을 갖지 못한다. 과거라면 신제품 반응이 미지근할 때 “시간이 지나면 입소문이 날 거야”라는 말로 위기를 덮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데이터는 어떤 연령대에서 반응이 약한지, 어떤 채널에서 병목이 생겼는지, 가격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요즘의 리더는 데이터를 읽어야 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히 수치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다. 데이터 속에 숨은 맥락을 읽고, 그 안에서 문제의 징후를 감지하며,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힘이다. 리더가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조직은 ‘감’이라는 안개 속을 헤맨다. 반대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리더는 불안을 걷어내고,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이끈다.
<i>#숫자 너머의 다정함</i>
스포츠에서 기계가 만들어낸 변화는 무엇보다 ‘공정함’이다. 투구 판정 시스템은 선수 키에 맞춰 스트라이크존을 그리고, VAR은 오프사이드 선을 정밀하게 긋는다.
덕분에 선수들은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줄었다. 운이나 명성으로 얻던 유리함도 함께 사라졌다. 기계는 선수의 경력도, 명성도, 별명도 모른다. 오직 거리와 궤적, 속도, 비율로만 판단할 뿐이다. 기울어진 경기장이 평평해지는 순간, 권위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실력뿐이다.
기업의 세계에서도 사정은 같다. 공정함이 조직 안에 뿌리내릴수록 직급이나 연차 같은 간판은 점점 빛을 잃는다. 이름표 대신 결과가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인재인가요?’ 리더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실력과 신뢰 위에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보고서 하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예전 같으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야.” 이 한마디면 대화는 끝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지표와 수치가 화면에 떠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팩트가 있다. 감과 경험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
그렇다고 데이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속이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억울함을 삼킨다. 공정하다는 이름 아래에서도 감정은 여전히 남는다. 리더십은 그 간극에서 드러난다. 데이터를 읽는 능력과 마음을 읽는 능력.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이 지금의 리더다.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새로운 세계가 어떤 이에게는 낯설고 차갑다. 데이터는 잘못된 발표를 즉시 드러낸다. 그 순간 발표자의 마음은 흔들린다. 과거라면 리더가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라며 덮어 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대신 옆에서 조용히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말을 해주는 리더가 필요하다.
기계는 공정하다. 그러나 다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보다 복잡하다. 애매하고, 때로는 불합리하다. 그렇기에 위로는 언제나 사람의 몫이다. 데이터가 조직의 뼈대를 세운다면, 그 뼈대에 온기를 불어넣는 건 결국 말의 힘이다. 실수를 감싸 안고 마음을 잇는 능력. 그것으로 리더는 기억할 만한 리더가 된다.
이제는 심판에게 달려들 일도, 소리쳐 쫓겨날 일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쓸모 없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다. 기계가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만큼은 여전히 리더의 몫이다. 그래서 리더는 데이터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 두 가지 문법을 함께 배워야 한다.
기계가 공정함을 완성한다면, 사람은 관계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리더십은 다시 태어난다. 숫자 뒤에 숨은 맥락을 읽고, 말하지 못한 감정을 알아채며, 흩어지는 마음을 다시 한 방향으로 묶어내는 일. 그것이 오늘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김주수 휴넷L&D연구원장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