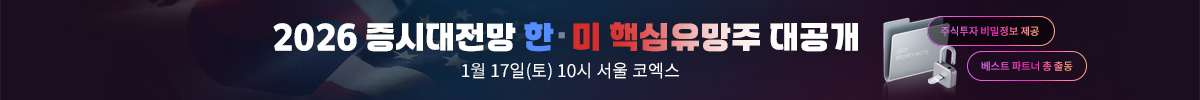Q. 마침내 신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올해 5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2025년, 신정부 출범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아
- 2024년, 무려 74개국서 크고 작은 선거 치러져
- 정치적 거버넌스, 경제와 증시 미치는 부담 커
- 세계, 안보와 경제 간 연계로 중층적 관계 심화
- 美, 트럼프 진영과 반트럼프 진영 간 갈등 심화
- 세계 경제, 협조보다 갈등으로 1%p 성장 둔화
- 초기 착오, 갈등 마무리하고 협조 모색할 것인가?
Q. 말씀하신 갈등의 그 중심이 선 것은 올해 1월 20일에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지 않습니까?
- 세계 경제 갈등과 둔화 주요인, ‘트럼프 관세’
- 트럼프 관세, 노이먼-내쉬식 이기적 게임 방식
- 카르타고식 DonRoe 주의, 국제협조 체제 붕괴
- 트럼프 관세, 섀플리-로스식 공생적 게임으로?
- 케인즈식 평화방안, 세계 경제 ‘호황’·증시 ‘랠리’
- 트럼프의 반성, 과연 관세정책에 변화줄 것인가?
- 영구 집권 꿈꾸는 트럼프, 변화줄 가능성은 희박
- 준비 중인 관세 플랜 B, 관세 플랜 A보다 완화될까?
Q. 워낙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관심되다 보니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선진국, 신흥국별로 권역별 성장률은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취약국이 두터운 K자형 양극화 구조, 더 심화
- 개별국 성장률이 많이 포함될수록 평균의 함정
- 세계 경제 성장률과 권역별 성장률 무용론 나와
- 경기순환, 노랜딩(no landing) 정착 확률 제고?
- 경기순환 네 국면과 저점·정점의 의미가 퇴색
- 순환 국면 없어진 만큼 침체와 회복 경계 약화
- 지표보다 체감 경기, 프레임보다 플레이밍 효과
Q. 3대 예측기관들의 개별국가 성장률을 보면 올해 들어서는 랜드 러시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분절화 현상 심화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양극화 현상, 더 빨리 진행
- 코로나 사태와 또 다른 새로운 공급망 체계 붕괴
- land lush, 땅따먹기 놀이처럼 ‘원시형 경제’
- ‘I’자형·’L’자형·‘W’자형·‘U’자형·‘V’자형· 나이키형·스네이크형·skyrocketing형 공존
- GBK, 어느 국가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성과 차이
- 금융시장, 뉴노멀 테일 리스크로 변동성 확대
Q. 미국의 이기주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통상환경도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WTO·IMF 등 종전의 다자채널 급속히 약화
- 트럼프, 어렵게 구축해 온 다자채널 붕괴 주도
- 美의 재원 중단 막힌 다자채널의 향후 운명은?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 간의 연대
- TIPF와 EPA, 새로운 개념의 통상체계로 정착
- TIPF나 EPA, 어느 국과 체결하느냐 따라 명암
미·중 관계,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간 회색지대
Q. 국제협력 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연초에 예상한 것처럼 지경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보와 경제 연계, 지경학적 위험이 더 높아져
- 올해 들어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등이 가세
- 동북아 지역 지경학적 위험, 최대 관심사로 부각
- 무임승차 방지 트럼프의 정책, 동맹국 어떤 입장?
- 위기 몰린 시진핑, ‘일국일제’ 명목으로 대만 침공
- 한반도 지경학적 위험, 트럼프 정부 어떤 변화?
- 방위비 지출 증대, 방산 르네상스 시대 전개되나?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한계에 도달한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자 않습니까?
- 2024년, 코로나19 종료되는 실질적인 첫해
- 세계 경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 이상기후 등 디스토피아 문제가 새로운 변수
- 대형 산불 등 우리도 이상기후 피해 현실화
- 슈퍼 엘리뇨 현상 위력, 발생 2년 차에 더 져
- 올해는 ‘초(超·hyper)’자 붙여도 부족하다 경고
- 최대 관심, 과연 기후목표 1.5도 깨질 것인가?
- 1차 에너지 중시 트럼프, 원전 등으로 정책 변화
Q.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더 상세하게 알아봐야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국가부도 위험으로 국채시장에 대혼란이 지속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올해 출범한 신정부, 대부분 확장적 재정지출
- 국가채무, 위험수준을 넘어 디폴트 위험 증대
- 선진국 112%·美 123%·日 255%·韓 54% 등
- 대부분 선진국, 국채 텐트럼과 국채금리 상승
- 트럼트 감세, 6월 X-date 어떻게 넘길 것인가?
- 日 소비세 감면, 7월 디폴트 위기설 어떻게 차단?
- 영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국가도 동일한 상황
- 부도 위험 높은 국채 거래로 세컨더리 마켓 활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