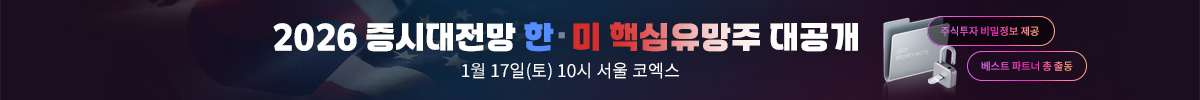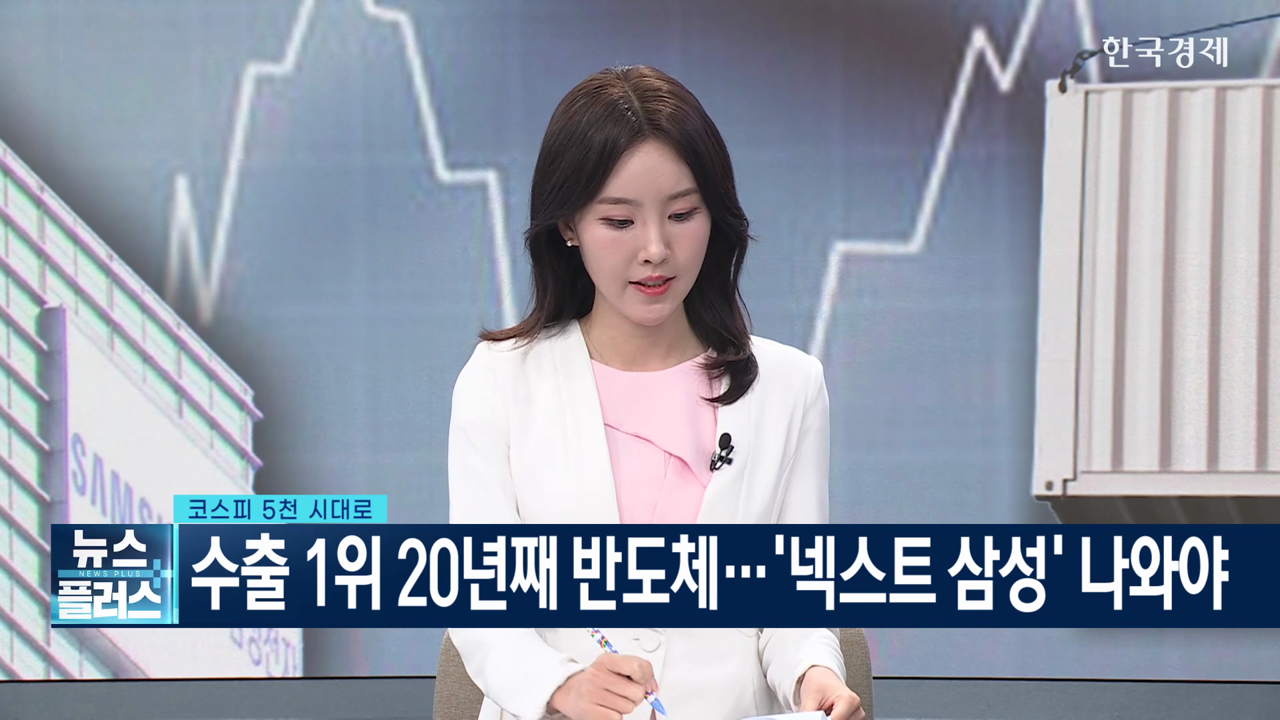시가총액 1위 자리는 산업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한국 증시에선 삼성전자가 25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한국경제TV 특별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 오늘은 경직된 자본시장과 산업구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우리나라 산업구조 얼마나 경직됐습니까?
<기자>
1995년 대한민국 수출 품목 1,2위가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5년에도, 다음 2015년에도 그리고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 조선업이나 석유화학 호황에 일부 순위가 바뀐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10대 품목으로 넓혀 봐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성하는 품목 10개 중 8개가 같을 정도입니다.
산업 고도화를 이뤄 어느덧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볼까요.
중국은 컴퓨터부품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 완제품으로 다시 스마트폰으로 1위 품목이 변했습니다. 10대 품목은 2개 빼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앵커>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25년째 1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하나요. 산업계 전반에 혁신이 부족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년간 글로벌 첨단 산업의 중심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다시 AI로 격변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지켜낸 건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는 물론 세계 경쟁력을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에 90나노미터급 D램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12나노급 D램을 양산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도체에선 공정혁신을 계속했고요. 폴더블 폰처럼 과감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그룹에 안착한 현대차 등 다른 주력 산업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부 20년 전에도 잘해왔던 전통 대기업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의 매그니피센트 7처럼 새로운 혁신 기업이 등장해 성장 스토리를 써낸 건 아닙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총 1위 교체 문제보다도 한국 자본시장이 대기업을 길러낸 사례 자체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자>
정부와 기업, 자본시장 모두 실책을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력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했고요.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출구로 활용되거나 중복 상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인의 인식을 사례로 들 수 있죠.
한 번 증시 상장을 하면 그 다음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로 유상증자는 좀처럼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입니다.
결국 꾸준히 번 돈으로 성장해야한다는 의미인데 일거에 시장 지배력 확보가 필요하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키워내기 어렵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을 10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투자입니다. 결국 자본 조달과 연결되는데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새 정부에서 제시한 AI 100조원 펀드처럼 정부에서 도와주고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삼성전자 10개 만들기는 가능하다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자본을 조달하면 할수록 경영권 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해 얻을 수 있었던 건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 뿐만 아니라 김범석 의장에게 주어진 1주당 29개의 차등의결권이었습니다.
기업인이 본질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주주들의 이익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은 창업주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2021년 도입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