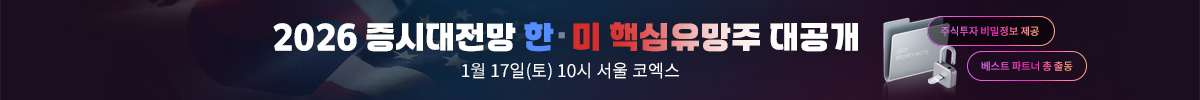우리나라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집계됐다. 재무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영역에서 빈부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4개 영역에서 측정한 국민의 노후준비 점수는 5년 전 67.5점에서 2.4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전국 30~69세 성인 3,040명을 대상으로 4개 영역, 37개 진단지표를 활용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역별 점수는 건강 74.5점, 재무 67.6점, 대인관계 64.9점, 여가 60.3점 순이었다. 대인관계는 가족·친구·이웃 등과의 관계, 여가는 취미·여가활동 참여 빈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2019년 조사와 비교하면 재무 점수는 7.3점 올랐으나, 대인관계 점수는 2.4점 하락했다. 보고서는 가족 형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점수도 높았다. 경제수준 '상' 그룹은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이었다. 재무(상 73.4점·하 64.6점), 여가(상 64.4점·하 57.3점), 대인관계(상 68.2점·하 63.4점), 건강(상 76.5점·하 73.1점) 등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격차가 확인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71.0점)이 없는 사람(65.6점)보다, 다인 가구(70.8점)가 1인 가구(65.0점)보다, 대도시 거주자(72.1점)가 농어촌 거주자(67.2점)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6.9점으로 가장 낮고, 40대가 71.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평균 6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60대는 70.7세까지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선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을 줬다.
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노후준비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진단지에 인구사회학적 변수 추가와 20대 포함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