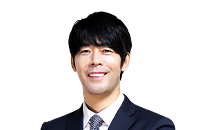두 은행의 DLF 판매 건은 불완전판매 논란을 일으키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금융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무리하게 고위험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위험관리 역량부터 ‘투자자 책임 원칙’까지 얽혀 있다. 한마디로 상품의 안정성·위험성·적정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고위험 상품을 설계한 증권·자산운용사, 투자 위험은 외면하고 수수료에 매달린 은행, 고수익에 솔깃했던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금까지 날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 방식이나 비율은 책임 소재에 비례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감독당국은 이번 사태가 빚어지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결과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툭하면 ‘사전 예방’과 ‘건전성 선제 감독’을 내세워 온 금감원이 건전한 감시·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문제 제기다. 여론을 좇으며 뒤늦은 징계만 내리고 스스로 책임은 면탈하는 모습을 보면 금융감독의 선진화는 아직 한참 멀었다.
금감원이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갖는다. 지난해까지 내리 2년간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로 유보된 바 있다. ‘금융의 자율’ ‘감독업무의 독립’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감시나 감독을 빌미로 무조건 사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하면서 충격 없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거친 사후 징계를 남발하면 ‘신(新)관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전 예방 책임에서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