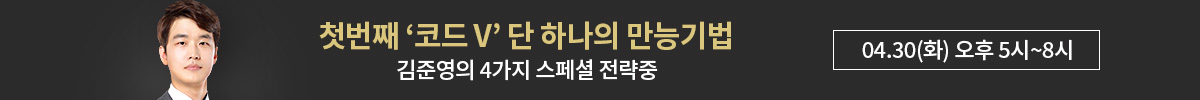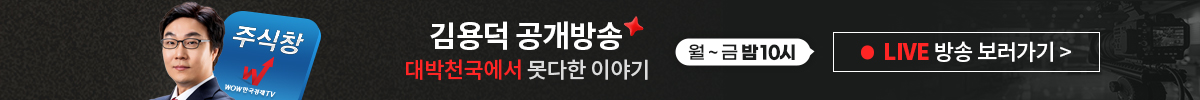12월 마지막 날. 달력의 뒷장이 없다. 아이는 학교에서 달력을 만들어왔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요한 날마다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 자기 생일, 어린이날, 개교기념일이 눈에 띈다. 가장 기다리는 날이란 뜻일 테다. 2022년 달력을 벽에서 떼어내면서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 내가 기다리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1년이 이렇게나 순식간이라니 믿을 수 없다.
12월 마지막 날. 달력의 뒷장이 없다. 아이는 학교에서 달력을 만들어왔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요한 날마다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다. 자기 생일, 어린이날, 개교기념일이 눈에 띈다. 가장 기다리는 날이란 뜻일 테다. 2022년 달력을 벽에서 떼어내면서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 내가 기다리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1년이 이렇게나 순식간이라니 믿을 수 없다.김재근의 시 ‘여섯 웜홀을 위한 시간’에는 “인디언들은 새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톱을 땅에 묻어준다”는 문장이 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라면 무턱대고 믿어보고 싶다. 시간을 고스란히 바쳐 길러낸 손톱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껏 너무 함부로 버려온 것 같다. 간절한 기다림의 순간을 잊어 온 날들이다.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카카오톡에서 가장 기분 나쁜 상대의 답변이 뭔지 알아?” 기분 좋은 연말에 가장 기분 나쁜 답변을 떠올리고 싶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회사에서 소통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가 제시한 가장 기분 나쁜 상대의 답변은 ‘읽씹’이었다고 한다.
친구는 며칠 전 한 단체 채팅방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은 모양이다. 그의 질문에 늦지 않게 대답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그는 내게 전화해 하소연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까지 답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때 그의 말을 충분히 들어줬어야 했는데, 백화점에서 친구와 장갑을 고르는 중이라 그러지 못했다. 해소되지 못한 마음은 반복적으로 현재와 연결된다. 누구에게라도 충분히 이해받았다면 가장 기분 나쁜 상대의 답변이 ‘읽씹’이라는 강사의 말에 크게 공감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읽씹’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는 중이라던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던가. 미안해서 말을 꺼내기가 힘들다던가.
나는 친구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해 보리라 작정하고 그의 이야길 들었다. 그러자 친구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적어도 그들에게 나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무엇을 기대하건 간에 그는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는 그들의 답변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나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내게 언제나 늦지 않은 답장을 하는 사람이었다.
눈을 기다리는 마음은 온전히 눈을 기다리는 사람의 것이고, 그 마음 덕분에 눈 내리는 날이 아름다워진다. 나는 답변을 기다렸을 친구의 마음을 오래오래 생각했다. 저마다의 바쁜 사정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아껴 챙긴다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불균형한 관계의 기울기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게로 기울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한가.
친구는 여행작가 손미나의 글을 좋게 읽었다며 <스페인 너는 자유다>의 한 대목을 이야기해 줬다. 스페인의 한 청년에게 고백받은 손미나 작가가 청년에게 “너는 나보다 어려서 안 돼”라고 말했고 그 말에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건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좋아”라는 말처럼 이상한 말이라고 했단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서래가 해준에게 한 말도 생각났다. 서래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해준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좋아함을 멈춥니까?” 스페인 청년도 서래도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원하는 대답을 듣진 못했어도 사랑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눈처럼 아름답다.
 달력 공장이 가장 바쁠 때가 8월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겨울이 오길 기다리면서 공장은 출렁거리는 잉크 냄새로 가득했겠지. 그 열기 속에서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주름을 갖게 됐으리라. 달력이란 이미지를 떠올리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가장 먼 것까지 나열하게 된다. 달력은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고니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아주아주 평범한 날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루하루 빗금 그어가며 기다리면 모든 날이 소중해진다.
달력 공장이 가장 바쁠 때가 8월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겨울이 오길 기다리면서 공장은 출렁거리는 잉크 냄새로 가득했겠지. 그 열기 속에서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주름을 갖게 됐으리라. 달력이란 이미지를 떠올리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가장 먼 것까지 나열하게 된다. 달력은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고니가 되기도 하고 비행기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아주아주 평범한 날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루하루 빗금 그어가며 기다리면 모든 날이 소중해진다.작년엔 눈 쌓인 서울을 구경하지 못했다. 기다리지 않은 날이라서 눈이 왔다는 소식도 못 듣고 잠만 쿨쿨 잤다. 올해는 눈이 10㎝나 쌓였다. 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눈싸움을 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시인은 “골목과 골목 아닌 곳이/온통 눈이었다./ 엄청난 쓰레기인 눈더미,/하늘이 우리에게/쓰레기를 치우라고 그 많던 눈을 퍼부었단 말인가?”(최승호, ‘바보성인에 대한 기억’)라고 질문했다. 기다리지 않은 눈은 쓰레기가 되고 마는데, 어린 시절엔 단 한 번도 눈을 쓰레기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
달력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아니, 더 멀리 가야 한다. 새 달력에는 되도록 많은 날에 빨간펜으로 표시를 해두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시인의 달력이라면 더욱 더 많이.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