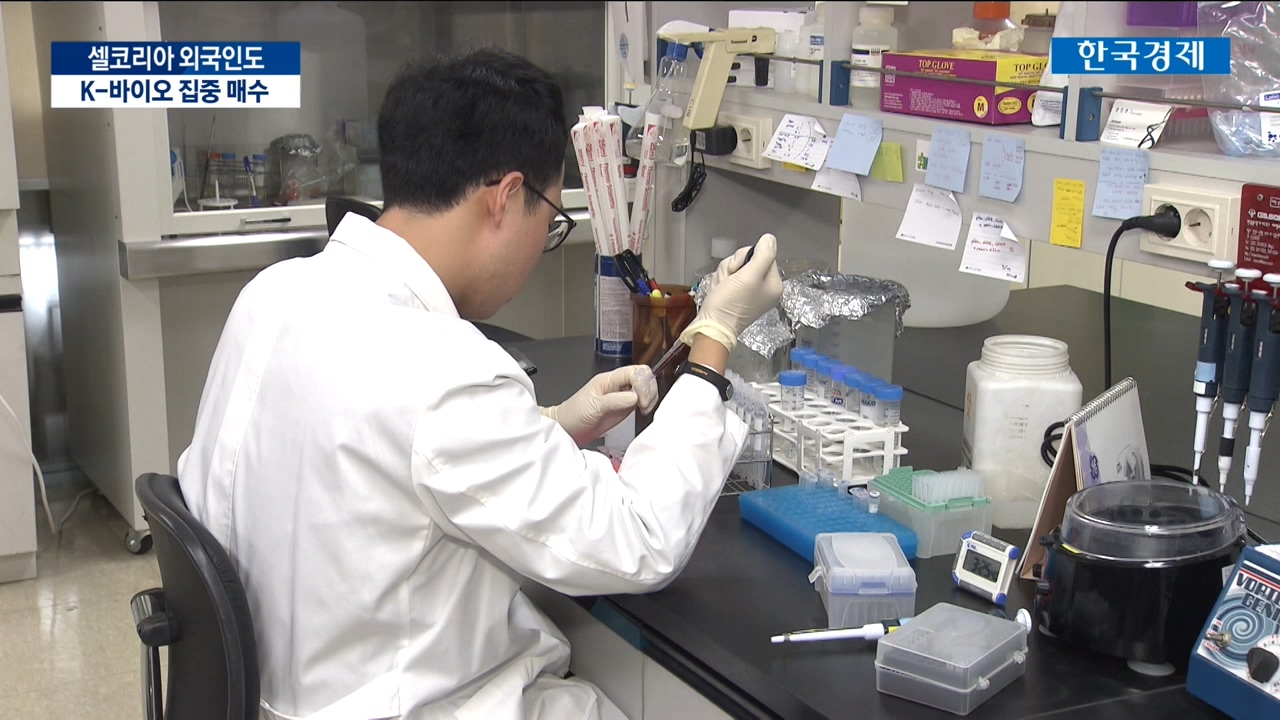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국내 증시에서 유독 제약·바이오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도주로 부상한 것은 물론, 각종 임상 등 호재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일수록 실적이 뒷받침 되는 업체 위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국내 증시는 '코오롱'의 날이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임상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코오롱 계열사 중 무려 여덟 종목의 주가가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즉, 바이오가 시장을 움직인 셈인데, 이같은 상황은 한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대표되는 제약·바이오주가 주도주로 재부상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KRX) 헬스케어 지수는 최근 한 달 간 2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셀코리아'가 본격화된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제약·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 각각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생산설비 확보 등의 호재가 작용했습니다.
대장주 뿐 아니라 에이치엘비나 코미팜 등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도 코로나19 수혜를 톡톡히 받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금지정책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6개월 금지정책을 시행하면서 공매 잔액 비율이 높은 바이오주가 수급면에서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주가가 오른 만큼 껑충 뛴 주가수익비율(PER)은 투자에 앞서 눈 여겨 봐야 할 지표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고질적인 한계인 가격 거품 논란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테마가 아니라 실제 파이프라인이 신약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레퍼런스(사업 구축 사례),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파이프라인을 한번도 성공시켜본 적 없는 기업들이 단순히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면 굉장히 후폭풍이 강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신약 개발이나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초체력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은 경계하되,
다수의 연구·개발(R&D)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관련뉴스